2025-03-31 10:00
판례/ “물류창고에 얼어붙은 대위권”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3.17자에 이어>
<평석>
1. 시작하며
이번 호에서 소개할 판례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험자 대위권을 행사했는데 이와 같은 행사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의 행사인지 여부 등에 관해 판단한 사례이다.
2. 사실관계의 요약
가. 2004년 1월1일 B사(현 C사)와 D사 간 진단사업부 상품의 보관 및 입출고 업무 위탁계약(“이 사건 물류서비스공급계약”)을 체결했다.
나. 2007년 1월2일 E사가 D사의 인체용 실험진단 사업부분을 양수했고 이 사건 물류서비스공급계약을 승계했다.
다. 원고는 E사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OOO 주식회사 외 9개회사”, 보험기간을 2006년 10월1일부터 2007년 10월1일까지, 동산에 대한 보험금을 미화 71,729,722 달러로 하는 내용의 재산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했다.
라. B사는 이 사건 물류서비스공급계약에 따라, 냉장설비(이하 ‘이 사건 냉장설비’라고 한다)가 설치돼 있는 OOO 소재 물류창고에서, E사 소유의 시가 1,222,841,469원 상당의 진단시약(이하 ‘이 사건 진단시약’이라고 한다)을 보관하고 있었다. 한편 이 사건 진단시약은 온도에 민감한 의료용 면역시약으로서 2~8℃의 온도에서 보관돼야 하는데, 피고는 평소 5℃ 내외의 온도로 위 진단시약을 보관하고 있었다.
마. 그런데 2007년 6월8일(금요일) 자정 무렵부터 2007년 6월11일(월요일) 오전까지 사이에 위 물류창고 내부의 온도가 영하 15℃로 된 사고가 발생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그로 인해 이 사건 진단시약이 전부 변질됐다. 이에 따라 E사는 위 진단시약을 모두 폐기하고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며, 원고는 2007년 11월22일 E사에게 보험금 1,191,372,719원을 지급했다.
바. 그 후 원고는 재보험사인 독일의 OOO사로부터 재보험금 1,218,018,957원을 지급받았다.
사. B사는 2009년 7월28일 주식회사 C사에 흡수합병됐고, 주식회사 C사가 B사의 소송수계인이 됐다(이하 편의상 B사와 C사를 합쳐 ‘피고’라고 부른다).
아. 원고는 2010년 4월경 E사로부터 위 보험금 1,191,372,719원에 상당한 E사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았으며, E사는 2010년 6월8일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피고에게 이러한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해 2010년 6월9일 도달했다.
3. 법원의 판단
1) 보험자대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이 사건 보험계약서상 피보험자는 “E 주식회사 외 9개 회사”로 돼 있고, 이에 따른 부속합의서에도 보험목적물은 피보험자의 소유이거나 피보험자의 법적 책임과 관련 있는 부동산과 동산이라고 돼 있을 뿐인 이상,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그 보험계약서에 기재된 “E 주식회사 외 9개 회사”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E사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E사에게 위 보험계약에 근거해 보험금을 지급했다거나 재보험사로부터 재보험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E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
2) 양수금청구
원고가 양수한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물류서비스공급계약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으로서 상법 제160조에 따른 것이고, 이러한 손해배상채권은 상법 제166조 제1, 2항에 따라 그 물건을 출고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거나, 임치물이 전부 멸실한 경우에는 임치물과 알고 있는 창고증권 소지자에게 그 멸실의 통지를 발송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2007년 6월11일 물류창고의 온도가 영하 15℃로 떨어진 사실을 임치인인 E사의 직원인 A 대리에게 알린 사실이 인정되는바(기록 제157쪽),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08년 6월11일경에는 E사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할 것이고, 한편 원고가 2010년 6월9일에 가서야 위와 같은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했음을 이유로 선택적으로 양수금청구를 추가하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E사의 피고에 대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은 원고가 제1차 환송전 당심에서 양수금청구를 하기 이전에 이미 그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3)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양수금청구
원고는 그 소멸시효 기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10년 6월9일자 준비서면을 통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양수금청구를 한 이상, 그 소멸시효가 중단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2010년 6월9일자 준비서면을 보면, 제1항에서 피고가 E사에 대해 채무불이행 내지 창고업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고, 제2항에서 원고가 E사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았음을 전제로 양수금청구를 한다는 취지로 기재돼 있을 뿐인바, 이는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았음을 전제로 양수금청구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가 위 준비서면을 통해 피고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E사의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았음을 전제로 양수금청구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소멸시효 중단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검토 및 시사점
보험자 대위권과 관련해, 이 사건 판례는 피보험자가 명시적으로 열거돼 있는 경우,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자는 피보험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 사건 보험 계약의 피보험자는 “E 주식회사 외 9개 회사”라고 명시돼 있었는데,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E사” 는 “E Medical Solutions Diagnostics Limited” 로, 계약서상 피보험자 회사와 다른 회사였다. 즉 해당 판결은 보험금 지급 시 계약상 피보험자인지 여부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켜 준다.
양수금청구와 관련해, 법원은 양수인이 취득할 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기간은 그 청구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을 재확인해주었다. 즉, 양수금청구는 양도인이 제3자에 대한 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해 이를 양수해 그 지급을 구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이 시효로 인해 소멸했다면 양수인이 이를 행사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1993년 6월29일 선고 93다1770 판결 참조).
또한 법원은 피고가 단순한 창고업자가 아닌 독점판매인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계약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은 일반 상사 소멸시효 5년이 적용돼야 한다는 원고 주장을 기각했고 피고를 상법 제155조의 창고업자로 보아 제166조의 단기 소멸시효 1년을 적용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원고의 재항변, 즉 이 사건 사고로부터 1년 이내에 보험자대위에 기한 이 사건 소를 제기했으므로, 위 손해배상채권은 시효중단이 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상의 청구가 시효중단의 사유가 되려면 그 청구가 채권자 또는 그 채권을 행사할 권능을 가진 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데 원고는 피보험자가 아닌 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사유만으로는 보험자로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없다고 해 아무런 권리 없는 자의 권리행사에 불과하다고 해 이를 기각했다.
결론적으로, 이 판결은 특히 외국계 법인의 경우 상호가 유사하더라도 계약상 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확인하는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준다.
<끝>
<평석>
1. 시작하며
이번 호에서 소개할 판례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험자 대위권을 행사했는데 이와 같은 행사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의 행사인지 여부 등에 관해 판단한 사례이다.
2. 사실관계의 요약
가. 2004년 1월1일 B사(현 C사)와 D사 간 진단사업부 상품의 보관 및 입출고 업무 위탁계약(“이 사건 물류서비스공급계약”)을 체결했다.
나. 2007년 1월2일 E사가 D사의 인체용 실험진단 사업부분을 양수했고 이 사건 물류서비스공급계약을 승계했다.
다. 원고는 E사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OOO 주식회사 외 9개회사”, 보험기간을 2006년 10월1일부터 2007년 10월1일까지, 동산에 대한 보험금을 미화 71,729,722 달러로 하는 내용의 재산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했다.
라. B사는 이 사건 물류서비스공급계약에 따라, 냉장설비(이하 ‘이 사건 냉장설비’라고 한다)가 설치돼 있는 OOO 소재 물류창고에서, E사 소유의 시가 1,222,841,469원 상당의 진단시약(이하 ‘이 사건 진단시약’이라고 한다)을 보관하고 있었다. 한편 이 사건 진단시약은 온도에 민감한 의료용 면역시약으로서 2~8℃의 온도에서 보관돼야 하는데, 피고는 평소 5℃ 내외의 온도로 위 진단시약을 보관하고 있었다.
마. 그런데 2007년 6월8일(금요일) 자정 무렵부터 2007년 6월11일(월요일) 오전까지 사이에 위 물류창고 내부의 온도가 영하 15℃로 된 사고가 발생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그로 인해 이 사건 진단시약이 전부 변질됐다. 이에 따라 E사는 위 진단시약을 모두 폐기하고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며, 원고는 2007년 11월22일 E사에게 보험금 1,191,372,719원을 지급했다.
바. 그 후 원고는 재보험사인 독일의 OOO사로부터 재보험금 1,218,018,957원을 지급받았다.
사. B사는 2009년 7월28일 주식회사 C사에 흡수합병됐고, 주식회사 C사가 B사의 소송수계인이 됐다(이하 편의상 B사와 C사를 합쳐 ‘피고’라고 부른다).
아. 원고는 2010년 4월경 E사로부터 위 보험금 1,191,372,719원에 상당한 E사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았으며, E사는 2010년 6월8일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피고에게 이러한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해 2010년 6월9일 도달했다.
3. 법원의 판단
1) 보험자대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이 사건 보험계약서상 피보험자는 “E 주식회사 외 9개 회사”로 돼 있고, 이에 따른 부속합의서에도 보험목적물은 피보험자의 소유이거나 피보험자의 법적 책임과 관련 있는 부동산과 동산이라고 돼 있을 뿐인 이상,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그 보험계약서에 기재된 “E 주식회사 외 9개 회사”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E사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E사에게 위 보험계약에 근거해 보험금을 지급했다거나 재보험사로부터 재보험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E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
2) 양수금청구
원고가 양수한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물류서비스공급계약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으로서 상법 제160조에 따른 것이고, 이러한 손해배상채권은 상법 제166조 제1, 2항에 따라 그 물건을 출고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거나, 임치물이 전부 멸실한 경우에는 임치물과 알고 있는 창고증권 소지자에게 그 멸실의 통지를 발송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2007년 6월11일 물류창고의 온도가 영하 15℃로 떨어진 사실을 임치인인 E사의 직원인 A 대리에게 알린 사실이 인정되는바(기록 제157쪽),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08년 6월11일경에는 E사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할 것이고, 한편 원고가 2010년 6월9일에 가서야 위와 같은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했음을 이유로 선택적으로 양수금청구를 추가하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E사의 피고에 대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은 원고가 제1차 환송전 당심에서 양수금청구를 하기 이전에 이미 그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3)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양수금청구
원고는 그 소멸시효 기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10년 6월9일자 준비서면을 통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양수금청구를 한 이상, 그 소멸시효가 중단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2010년 6월9일자 준비서면을 보면, 제1항에서 피고가 E사에 대해 채무불이행 내지 창고업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고, 제2항에서 원고가 E사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았음을 전제로 양수금청구를 한다는 취지로 기재돼 있을 뿐인바, 이는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았음을 전제로 양수금청구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가 위 준비서면을 통해 피고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E사의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았음을 전제로 양수금청구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소멸시효 중단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검토 및 시사점
보험자 대위권과 관련해, 이 사건 판례는 피보험자가 명시적으로 열거돼 있는 경우,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자는 피보험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 사건 보험 계약의 피보험자는 “E 주식회사 외 9개 회사”라고 명시돼 있었는데,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E사” 는 “E Medical Solutions Diagnostics Limited” 로, 계약서상 피보험자 회사와 다른 회사였다. 즉 해당 판결은 보험금 지급 시 계약상 피보험자인지 여부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켜 준다.
양수금청구와 관련해, 법원은 양수인이 취득할 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기간은 그 청구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을 재확인해주었다. 즉, 양수금청구는 양도인이 제3자에 대한 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해 이를 양수해 그 지급을 구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이 시효로 인해 소멸했다면 양수인이 이를 행사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1993년 6월29일 선고 93다1770 판결 참조).
또한 법원은 피고가 단순한 창고업자가 아닌 독점판매인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계약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은 일반 상사 소멸시효 5년이 적용돼야 한다는 원고 주장을 기각했고 피고를 상법 제155조의 창고업자로 보아 제166조의 단기 소멸시효 1년을 적용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원고의 재항변, 즉 이 사건 사고로부터 1년 이내에 보험자대위에 기한 이 사건 소를 제기했으므로, 위 손해배상채권은 시효중단이 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상의 청구가 시효중단의 사유가 되려면 그 청구가 채권자 또는 그 채권을 행사할 권능을 가진 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데 원고는 피보험자가 아닌 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사유만으로는 보험자로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없다고 해 아무런 권리 없는 자의 권리행사에 불과하다고 해 이를 기각했다.
결론적으로, 이 판결은 특히 외국계 법인의 경우 상호가 유사하더라도 계약상 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확인하는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준다.
<끝>
< 코리아쉬핑가제트 >
많이 본 기사
- 해운업계, 양대 해양대학에 100억 지원북미항로/ 중국발 수요 급감…선사들 “운임회복 쉽지 않네”동남아항로/ ‘중국 철강 수출제한 여파’ 새해 운임 내림세한중항로/ 2년 연속 물동량 신기록…지난해 357만TEU 달성한러항로/ 러 연휴로 연초 물동량 부진美 철도기업 합병 불발…규제당국 신청서 불승인중동항로/ 중국발 물량 꺾이자 한달새 운임 20%↓한일항로/ 공급 축소해도 화물 채우기 쉽지 않아중남미항로/ ‘선사들 집화경쟁 후끈’ 운임 3년만에 1200弗 붕괴HMM, 특수화물 온라인예약 실시…“운송절차 간소화”
- 태웅로직스, 30주년 맞아 ‘100년 기업’ 선언KMI, 동서대와 해운항만 미래인재 양성 맞손선박들의 피항처 ‘거문도’ 올해의 섬 지정中 양푸항, 지난해 ‘컨’ 처리량 330만TEU…전년比 65%↑아프리카항로/ 물동량 호성적에도 운임 약세 이어져호주항로/ 춘절 특수 없다…해상운임 약세로 전환靑 해수비서관에 이현 前 해수부 장관 정책보좌관구주항로/ 춘절특수 실종…공급조절·운임회복으로 극복中 광시-베트남 지난해 화물열차운송량 3.7만TEU ‘역대최대’“어렵고 까다로운 위험물 물류 함께 고민해요”
스케줄 많이 검색한 항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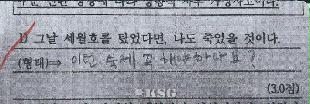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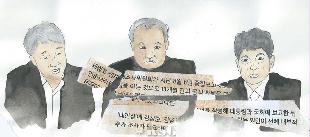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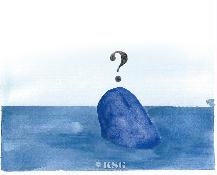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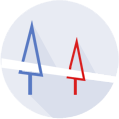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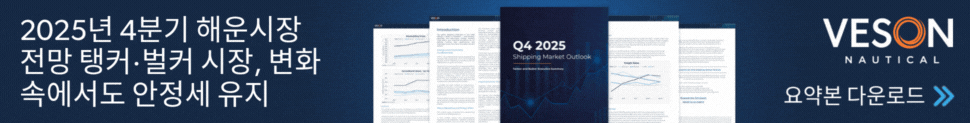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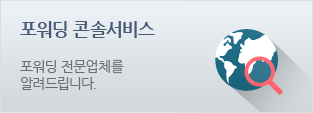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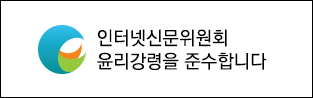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