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4 09:05
창간특집 기획취재/ 트럼프發 시장재편 움직임에 해운물류조선산업 요동
해운시황 컨·벌크 희비 엇갈려
항만·물류 예상밖 ‘호조’

2025년 상반기 해운물류조선시장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불러온 시장 질서 재편 움직임에 들썩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출범 이후 강력한 중국 제재 정책을 펴고 있다. 대중 제재의 신호탄을 알린 건 지난해 12월19일 미국 연방상선사관학교(Kings Point) 출신인 마크 켈리 상원의원(민주당)이 주도해 발의한 ‘미국의 번영과 안전을 위한 2024년 선박건조·항만 인프라법’(선박법)이다. 이 법은 미국 해운을 재건하고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10년 안에 미국 국적의 전략상선대 250척을 운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80척에 불과한 미국적 상선대를 재건하는 게 이 법의 목표다.
미국적선은 미국에서 건조돼 미국 깃발을 달고 미국 선원이 승선하는 선박을 의미한다. 미국 정부는 250척의 국적선을 한꺼번에 도입하기 어려운 점을 들어 2029년까지 외국에서 지어진 선박을 전략상선대로 허용하는 임시선박(interim vessel)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중국 러시아 북한 등의 우려 국가에서 건조됐거나 소유 운항하는 배는 임시선박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중 관세전쟁 유예로 깜짝 수요 출현
그런가 하면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월 중국과 관련된 선박에 막대한 입항 수수료를 징수하는 규제를 제안했다.
당초 입항세 규제는 ▲중국산 선박이 미국에 들어올 때 한 항구마다 150만달러를 받고 ▲중국 해운사가 운항하는 선박 또는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 비율이 50% 이상인 해운사가 운항하는 선박 또는 ▲중국에 발주한 신조선 비율이 50% 이상인 해운사가 운항하는 선박은 한 항구당 100만달러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초안이 마련됐다.
하지만 4월과 5월 2차례의 공청회를 거치면서 오는 10월14일부터 ▲중국 해운사가 운항하는 선박은 1t(순톤)당 50달러 ▲비중국 해운사가 운항하는 중국산 선박은 1t당 18달러 또는 20피트 컨테이너(TEU)당 120달러를 부과하는 것으로 대폭 후퇴했다. 아울러 부과 횟수도 연간 5회로 제한된다.
USTR은 입항세 부과 금액을 2028년까지 매해 4월17일마다 각각 30달러 5달러씩 인상할 예정이다. 3년 후인 2028년 4월17일 부과되는 입항세는 ▲중국 해운사가 운항하는 선박은 t당 140달러 ▲비중국 해운사가 운항하는 중국산 선박은 t당 33달러 또는 TEU당 250달러로 증액된다.
미국은 이와 별도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추가 관세를 도입하는 정책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제재의 초점인 중국엔 최대 145%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이에 대응해 미국산 상품에 125%의 보복관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다행히 양국은 5월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상호 관세 부과 조치를 90일간 유예하는 데 합의하고 관세율도 크게 낮췄다. 미국은 145%에서 30%, 중국은 125%에서 10%로 각각 완화했다.
이 같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해운시장에선 미국의 대중 제재가 시행되기 전에 화물을 수송하려는 ‘밀어내기 수요’가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미국 무역 정보 회사인 데카르트데이터마인에 따르면 올해 1~4월 아시아 10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된 컨테이너 물동량은 10% 늘어난 678만TEU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사태발 해운 호황기였던 2022년 같은 기간의 693만TEU에 이어 역대 2번째로 높은 수치다. 그 결과 공급 과잉으로 운임이 폭락할 거란 전망과 달리 컨테이너선 시장은 비교적 연착륙하는 모습을 띠면서 해운사들도 안정적인 실적을 받아들었다.
올해 벌크선 시장은 해운업계 큰손인 중국이 원자재 수입을 줄이면서 하락세를 띠고 있다. 중국 세관에 따르면 올해 1~4월 중국의 철광석 수입량은 3억8836만t을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의 4억1182만t에서 6% 감소했다. 이 밖에 석탄은 5% 감소한 1억5267만t, 곡물은 40% 감소한 3182만t, 대두는 15% 감소한 2319만t에 그쳤다. 수요 감소를 배경으로 1~5월 평균 벌크선운임지수(BDI)는 지난해 1819에서 올해 1204로 34% 하락했다. 벌크선 전 선형에서 시황 부진이 나타났다.
같은 기간 케이프사이즈 운임지수(BCI)는 지난해 2798에서 올해 1688로 40% 떨어졌고 파나막스 운임지수(BPI)와 수프라막스 운임지수(BSI)는 각각 34% 하락한 1159, 31% 하락한 872에 머물렀다. 비록 5개월치이긴 하지만 BSI 평균이 1000포인트 아래로 떨어진 건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컨테이너 운임도 두 자릿수의 하락 폭을 보였다. 상하이해운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5개월 평균 글로벌 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1620을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의 2095.2에 견줘 23% 내렸다.
상하이-미국 서안항로 평균 운임은 40피트 컨테이너(FEU) 기준으로 지난해 4159달러에서 올해 2947달러로 29% 떨어졌고 미 동안항로 평균 운임도 지난해 5505달러에서 올해 4127달러로 25% 하락했다. 북유럽항로 평균 운임은 20피트 컨테이너(TEU)당 지난해 2569달러에서 올해 1602달러로 38%, 지중해항로 평균 운임은 지난해 3550달러에서 올해 2548달러로 28% 각각 인하됐다.
다만 코로나19 사태 첫해인 2020년이나 이전 시기인 2019년에 비해선 높은 수준을 보였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올해 평균 SCFI는 2020년의 1265에 비해선 28%, 2019년의 811에 비해선 2배(100%) 올랐다.
‘HMM 견인’ 주요 국적선사 1분기 실적 두자릿수 개선
국적선사들의 1분기 영업실적은 선종별로 엇갈린 모습을 보였다. 컨테이너선은 상승 곡선을 그린 반면 벌크선사들은 대부분 부진을 보였다. 탱크선사는 견실한 성장을 신고했다. 영업실적을 발표한 국적선사 10곳은 1분기 동안 매출액 4조3873억원, 영업이익 8192억원, 순이익 8658억원을 합작했다. 매출액은 14% 늘어났고 영업이익은 26%, 순이익은 40% 급증했다. (해사물류통계 ‘주요 국적선사 2025년 1분기 영업실적’ 참조)
HMM이 합산 실적 성장을 견인했다. 국내 1위 선사는 1~3월 세 달 동안 영업이익 6079억원, 순이익 7265억원을 각각 거뒀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영업이익은 53%, 순이익은 56% 각각 향상됐다. 매출액은 지난해 2조2833억원에서 올해 2조8086억원으로 23% 성장했다. 평균 컨테이너 운임이 지난해 1350달러에서 올해 1358달러로 소폭(1%) 오른 데다 컨테이너 물동량이 89만TEU에서 93만TEU로 4% 늘어난 게 실적 성장을 견인했다.
팬오션은 매출액 1조238억원, 영업이익 1121억원, 순이익 627억원을 달성했다. 지난해에 비해 매출액은 19%, 영업이익은 16%, 순이익은 14% 각각 성장했다. 주력 사업인 벌크선이 외형 성장에도 두 자릿수의 영업이익 하락세를 겪었지만 LNG선이 4배(321%) 늘어난 315억원, 컨테이너선이 흑자 전환한 158억원의 영업이익을 각각 거두며 수익성 개선에 힘을 보탰다.
SM그룹 해운 부문은 1분기 동안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대한해운은 매출액 1565억원, 영업이익 437억원, 순이익 743억원을 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46% 42% 감소한 반면 순이익은 32% 성장했다. 초대형 유조선(VLCC) 매각 대금이 유입된 게 순익 성장의 배경이 된 걸로 파악된다.
대한해운LNG는 매출액 894억원, 영업이익 237억원, 순이익 34억원을 거뒀다. 매출액은 5%,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38% 84% 감소했다. 다만 대한해운과 대한해운LNG는 28% 안팎의 영업이익률을 각각 달성해 이 부문 1~2위를 나란히 차지했다. 대한상선은 매출액 510억원, 영업손실 52억원, 순손실 195억원, 창명해운은 매출액 68억원, 영업손실 23억원, 순손실 21억원을 각각 냈다. 매출액은 각각 40% 53%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전년도 47억원 9억원에서 적자로 돌아섰다.
KSS해운은 높은 실적 성장을 신고했다. 매출액은 22% 성장한 1376억원, 영업이익은 42% 늘어난 297억원을 달성했다. 반면 순이익은 외화환산이익 감소 여파로 2% 감소한 115억원에 그쳤다. 동방(해운부문)은 매출액 546억원, 영업이익 64억원, 순이익 61억원을 보고했다. 매출액과 순이익은 각각 12% 19% 감소한 반면 영업이익은 10%의 두 자릿수 성장률을 냈다. 동방 해운부문은 큰 폭의 실적 감소를 낸 대한상선을 제치고 10개 선사 중 6위를 차지했다.
장금상선 계열사인 흥아해운은 매출액은 8% 늘어난 398억원, 영업이익은 18% 감소한 45억원, 순이익은 33% 늘어난 45억원을 각각 거뒀다. 설립 3년차를 맞은 STX그린로지스는 42% 늘어난 187억원의 매출액을 거뒀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15억원 -18억원을 내며 적자 전환했다.
글로벌 컨선사들 트럼프발 관세 파고에도 선방
올해 1분기 글로벌 컨테이너선사들은 트럼프발 관세 여파와 평균 운임 하락에도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순항했다. 대만 양밍해운을 제외한 선사들이 수익 개선에 성공했다. (해사물류통계 ‘글로벌 컨선사 2025년 1분기 영업실적’ 참조)
덴마크 AP묄러-머스크그룹은 1~3월 동안 해상운송 사업 부문에서 매출액 89억1000만달러(약 12조7000억원), 영업이익 7억4300만달러(약 1조1000억원)를 각각 냈다고 밝혔다. 영업이익은 전년 -1억6100만달러에서 흑자 전환했다. 매출액도 전년 80억900만달러와 비교해 11.2% 증가하며 외형 확대에 성공했다. 프랑스 CMA CGM 역시 전년 대비 각각 11.5% 30% 증가한 87억5800만달러(약 12조2000억원)의 매출액과 25억3100만달러(약 3조5000억원)의 EBITDA(상각 전 영업이익)를 각각 기록했다.
같은 기간 독일 하파크로이트는 전년 3억9400만달러에서 23.6% 증가한 4억8700만달러(약 700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매출액도 53억1800만달러(약 7조4000억원)로 전년 46억2300만달러와 비교해 15% 증가했다. 이스라엘 짐라인은 매출액 20억700만달러(약 2조8000억원), 영업이익 4억6400만달러(약 6000억원)를 각각 달성했다. 매출액은 전년 15억6200만달러에서 28.5%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전년 1억6700만달러에서 2.8배(177.8%) 폭증했다.
일본 컨테이너선사 ONE은 2024회계연도 4분기(2025년 1~3월) 매출액 43억1200만달러(약 6조2000억원), 영업이익 2억2300만달러(약 3200억원)를 각각 기록했다. 매출액은 전년 같은 기간의 38억6400만달러에서 11.6%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이 밖에 중국 코스코는 해상 부문에서 1~3월 석 달 동안 매출액 72억400만달러(약 10조원), 영업이익 20억5700만달러(약 2조9000억원)를 각각 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60억8300만달러 11억5100만달러에 비해 18% 78.7% 각각 증가했다.
대만 선사들의 영업실적은 희비가 교차했다. 에버그린은 매출액 1100억NTD(약 5조900억원), 영업이익 293억NTD(약 1조3600억원)를 각각 일궜다. 매출액은 전년 886억NDT에서 24.1%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157억NTD에서 87.4% 급증했다.
양밍해운은 매출액은 전년 438억NTD 대비 3.9% 증가한 455억NTD(약 2조1000억원)를 거뒀다. 반면, 영업이익은 8% 감소한 72억NTD(약 3300억원)에 그쳤다. 이 회사는 2024년 1분기엔 영업이익 79억NTD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완하이라인은 매출액 371억NTD(약 1조7200억원), 영업이익 92억NTD(약 4300억원)를 각각 냈다. 1년 전 276억NTD 22억NTD에 비해 매출액은 34.3%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4.2배(314.7%) 급증했다.
현대글로비스 대폭 성장 vs 롯데 부진
분기별 실적을 공시하는 국내 주요 2자물류기업 3개사는 올해 1분기 제각각의 실적을 기록했다. 현대글로비스와 삼성SDS(물류사업)는 외형 성장을 일군 반면, 최근 코스피 상장에 도전했다가 기업공개(IPO)를 철회한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유독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해사물류통계 ‘2025년 1분기 종합물류기업 실적’ 참조)
물류기업 3곳의 1분기 평균 영업이익률은 3.9%로, 1년 전 같은 기간과 동일했다. 현대글로비스의 영업이익률은 1.1%p 오른 6.9%를 기록했다. 반면 삼성SDS(물류사업), 롯데글로벌로지스는 각각 1%p 0.1%p 떨어진 2.3% 2.4%의 영업이익률을 내는 데 그쳤다.
현대글로비스는 올해 1분기 물류, 해운, 유통 등 모든 사업부문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뒀다. 매출은 9.7% 늘어난 7조2233억원,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30.4% 30.1% 폭증한 5019억원 3982억원을 기록했다. 현대글로비스는 고환율, 고운임의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부문별로 물류사업은 2조4580억원의 매출액을 거두며 1년 전보다 8% 성장했다. 영업이익 또한 9% 증가한 1981억원이었다. 특히 해외 완성차 내륙운송과 부품의 수출입물류 매출이 증가했다. 해운사업은 고운임 비계열 물량이 확대된 데다 선대운영 합리화로 원가 구조를 개선하면서 호실적을 냈다. 매출 1조2570억원 영업이익 1372억원을 기록, 각각 9.2% 66.3% 늘어났다. 고환율 효과를 누린 유통사업은 매출이 11% 증가한 3조5084억원, 영업이익이 38.1% 증가한 1665억원이었다.
삼성SDS는 IT서비스를 제외한 물류 사업만 보면 1분기에 두 자릿수로 성장한 매출을 올렸다. 이 회사의 올해 1분기 전체 매출액은 3조489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2685억원 2177억원을 기록하며 각각 18.9% 0.4% 늘었다. 이 가운데 물류사업에선 매출액은 11.6% 성장한 1조8894억원, 영업이익은 24.1% 감소한 426억원을 거두면서 외형과 수익성 간 명암이 갈렸다.
삼성SDS 측은 영업이익은 감소했지만 미국 상호관세 발효 전 조기 선적 수요에 따른 물동량 증가로 매출액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급망 관리 디지털 물류 플랫폼인 첼로스퀘어가 2850억원의 매출액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하면서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도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1~3월 동안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모든 부문에서 악화된 수치를 받아들었다. 매출액은 6.6% 감소한 8272억원, 영업이익은 10.6% 감소한 200억원, 순이익은 24.7% 감소한 53억원이었다. 외형은 축소됐어도 이익은 개선됐던 지난해 1분기와 상반된 모습이다.
이 회사는 지난 4월 보통주 공모에 앞서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진행했으나 충분한 투자자를 모집하지 못하고 공모 철회를 선택했다. 회사 측은 “안정적인 사업 구조와 수익성을 확보하고 있다”며 “향후 추가적인 수익성을 확보한 뒤 상장 재추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 물량 확대에 외형 성장…수익성 전반 감소
국내 주요 항만물류기업 6개사는 올해 1분기에 물동량 회복과 글로벌 사업 호조에 힘입어 외형 성장을 일궜다. 수익성은 6곳 중 4곳이 악화됐으나 기업별로 2곳은 이익 구조를 개선하면서 상반된 실적을 냈다. (해사물류통계 ‘2025년 1분기 6대 항만물류기업 실적’ 참조)
6대 항만물류기업의 1분기 평균 영업이익률은 3.2%로 전년 동기 대비 0.5%p 후퇴했다. 한진 세방 인터지스 등 3곳의 영업이익률은 각각 3.7% 3.3% 4.8%를 기록, 1년 전 같은 기간에 견줘 0.4%p 0.1%p 2.5%p 상승했다. 반면 CJ대한통운 동방 케이씨티시 3곳은 각각 2.9% 4.2% 3%의 영업이익률을 냈고, 0.8%p 0.3%p 2.6%p 하락했다.
CJ대한통운은 물류 아웃소싱 수주를 확대하면서 매출은 늘었지만, 내수소비 침체와 ‘매일 O-NE’와 미국 콜드체인 등 신사업 확대에 따른 초기 원가 증가로 수익성을 챙기지 못했다. CJ대한통운의 1분기 매출액은 2조992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했다. 반면 영업이익은 21.9% 감소한 854억원, 순이익은 26.1% 감소한 410억원에 머물렀다.
부문별로 택배·이커머스(O-NE) 매출은 1년 전보다 6.5% 줄어든 8762억원, 영업이익은 35.9% 줄어든 343억원으로 집계됐다. CL(계약물류) 사업은 신규수주가 늘면서 매출액은 16.7% 증가한 8135억원, 영업이익은 초기 원가 반영으로 3.9% 감소한 397억원을 각각 냈다.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는 글로벌 사업은 6.2% 증가한 1조1430억원의 매출액과 전년과 비슷한 116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한진은 매출과 수익성을 모두 붙잡았다. 특히 지난해 -34억원이었던 순이익은 흑자로 전환했다. 1분기 매출액은 글로벌 사업 호조에 힘입어 2.4% 늘어난 7291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16.7% 늘어난 273억원을 냈고, 순이익도 5억원을 거뒀다. 이 기업은 컨테이너터미널 처리 물량을 늘리고, 메가허브를 중심으로 운영 원가를 절감하면서 내실을 강화했다.
세방은 올해 첫 3개월 동안 매출과 이익 지표 모두 뒷걸음질 쳤다. 매출액 3254억원, 영업이익 107억원, 순이익 28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2.8% 0.9% 27.6% 후퇴한 성적을 냈다. 동방 역시 외형과 이익의 동반 부진을 신고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은 2.7% 감소한 2050억원, 영업이익은 8.4% 감소한 87억원이었다. 순이익은 105억원에서 62억원으로 대폭(41%) 줄었다.
케이씨티시는 올해 1분기 동안 지난해와 정반대 행보를 보였다. 매출액은 8.6% 증가한 2219억원을 낸 반면,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42% 60.1% 감소한 67억원 36억원을 기록했다. 반대로 지난해 1분기 모든 실적이 악화됐던 인터지스는 올해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매출액은 1739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10.7% 성장했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83억원 60억원으로 세 자릿수(130.6% 119.2%) 증가했다.
세계 10대 항만 물동량, ‘트럼프 효과’ 8% 성장
세계 10대 항만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대외 불확실성과 변동성에도 올해 1~3월 동안 플러스 성장을 거뒀다. 특히 상위권에 포진한 중국 항만 6곳의 평균 성장률은 8.9%를 기록, 지난해(14.5%)보다 둔화됐으나 여전히 견실한 성장을 이어갔다. (해사물류통계 ‘세계 10대 항만 1분기 컨테이너물동량 실적’ 참조)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발표하는 해운·항만·국제물류 주간리포트에 따르면, 중국의 춘절 연휴를 전후로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은 지속적으로 수요가 부진한 모습을 띠었다. 그러나 미국 신정부 출범과 동시에 2월13일(현지시간) 강력한 관세 정책을 예고하자 중국발 화물이 일시적으로 늘어나며 깜짝 성장했다.
올해 1분기 세계 10대 컨테이너 항만이 처리한 컨테이너 물동량은 20피트 컨테이너(TEU) 기준 7594만TEU로 집계됐다. 1년 전 같은 시기(7048만TEU)보다 7.7% 증가했다.
10개 항만 모두 플러스 성장을 거뒀다. 세계 최대 컨테이너 항만인 중국 상하이항은 첫 세 달 동안 1321만TEU를 처리했다. 전년 동기 대비 6.1% 증가한 수치다. 이어 싱가포르항은 처음으로 1분기 물동량 1000만TEU 고지를 넘어섰다. 지난해 997만TEU에서 5.8% 성장한 1055만TEU를 기록,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다. 3위 중국 닝보·저우산항도 1007만TEU로, 1년 전 같은 기간 914만TEU에서 10.2% 늘어나면서 두 자릿수 성장률을 유지했다.
4위는 840만TEU를 처리한 중국 선전항이었다. 이 항만은 지난해 1분기 같은 국적의 칭다오항에 4위 자리를 내줬으나 올해 물동량이 17.2% 증가하면서 다시 4위에 올라섰다. 이 같은 증가 폭은 10대 항만 가운데 최대다. 물동량으로 엎치락뒤치락 하던 칭다오항은 737만TEU에서 7.4% 늘어난 791만TEU로 집계됐다.
이어 ▲6위 중국 광저우항 643만TEU(7%) ▲7위 우리나라 부산항 626만TEU(4%) ▲8위 중국 톈진항 571만TEU(5.6%) ▲9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항(제벨알리) 399만TEU(10%) ▲10위 홍콩항 341만TEU(2.7%) 순이었다.
이 가운데 아랍에미리트(UAE)의 중심 항만인 제벨알리항은 3개월 동안 399만TEU를 처리, 지난해 363만TEU에서 두 자릿수 성장하는 성과를 냈다. 한편, 유럽 항만 가운데 유일하게 10위권을 넘봤던 로테르담항은 2.1% 늘어난 336만TEU를 처리했지만 올해는 순위 밖으로 밀려났다.
우리나라 부산항은 전 세계 항만 물동량이 상승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견고한 실적을 냈다. 전년 동기 601만TEU에 비해 4% 증가한 626만TEU를 처리하면서 1분기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수출입 물동량은 소폭(0.5%) 줄었지만 환적 물동량이 330만TEU에서 355만TEU로 7.8% 늘었다. 중국과 미국의 환적화물을 각각 12.4% 14.8% 더 처리한 것이 전체 물동량 증가로 이어졌다. 부산항은 2017년부터 매년 1분기마다 물동량을 경신하고 있다.
1분기 신조수주 점유율 중국 49% 한국 27%
중국 조선이 올해 1분기 한국 조선을 누르고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영국 조선해운조사기관인 클락슨에 따르면 1분기(1~3월) 선박 수주량에서는 중국이 우리나라를 크게 앞섰다. 중국 380만t, 우리나라 209만t으로, 전년 910만t 465만t 대비 58% 55% 각각 감소한 실적을 기록했다. 점유율은 중국 한국이 각각 49% 27%로 집계됐다. (해사물류통계 ‘국내 대형조선사 수주목표 및 달성률’ 참조)
1분기 수주 실적을 보면 중국이 2005년부터 21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3위 일본의 1분기 수주량은 전년 122만t 대비 84% 급감한 19만t이었다. 점유율은 2%에 그쳤다. 같은 기간 글로벌 발주량은 전년 1632만t 대비 52% 줄어든 779만t이었다.
국내 조선 빅 3의 올해 1분기 수주액은 지난해와 비교해 희비가 엇갈렸다. HD현대의 조선 중간 지주사 HD한국조선해양은 3개월 동안 53억2400만달러 규모의 수주액을 올렸다. 지난해 수주액 100억1800만달러와 비교해 46.9% 줄어든 수치다. 올해 수주 목표액인 180억5500만달러의 29.5%를 달성했다.
같은 기간 삼성중공업은 수주액 22억달러를 신고했다. 3개월 동안 연간 목표 98억달러의 22.4%를 채웠다. 한화오션은 올해 1분기 25억6000만달러를 수주했다. 지난해부터 수주 목표를 공개하지 않아 달성률을 확인할 수 없지만, 전년 1분기 23억5000만달러와 비교해 8.9% 증가한 수주액을 달성했다.
HD한국조선해양은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6조7717억원, 영업이익 8592억원, 순이익 6116억원을 각각 거두며 8분기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영업이익 순이익은 1년 전 1602억원 1933억원에 견줘 5.4배(436.3%) 3.2배(216.4%) 폭증했으며, 매출액은 5조5156억원에서 22.8% 신장했다. 영업이익률은 12.7% 기록하며 2019년 분할 이후, 분기 기준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HD한국조선해양은 고부가가치 선박 위주의 선별 수주를 통해 수익성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
삼성중공업도 올해 1분기 영업이익 신장을 이뤘다. 삼성중공업은 2025년 1~3월 석 달 동안 매출액 2조4943억원, 영업이익 1231억원, 순이익 901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779억원보다 58% 증가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2조3478억원에 비해 6.2% 신장했다. 순이익은 전년 78억원에서 11.6배(1055%) 폭증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연초 제시한 가이던스 매출 10조5000억원, 영업이익 6300억원 달성을 향해 순항 중”이라며 “수익성이 좋은 LNG운반선, FLNG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하되 수주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구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같은 기간 한화오션은 매출액 3조1431억원, 영업이익 2586억원, 당기순이익 2157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2조2836억원 대비 매출액은 37.6% 증가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전년 529억원 510억원에서 4.9배(388.8%) 4.2배(322.9%) 급증했다.
< 이경희 기자·최성훈 기자·박한솔 기자 >
많이 본 기사
- 해운업계, 양대 해양대학에 100억 지원북미항로/ 중국발 수요 급감…선사들 “운임회복 쉽지 않네”동남아항로/ ‘중국 철강 수출제한 여파’ 새해 운임 내림세한중항로/ 2년 연속 물동량 신기록…지난해 357만TEU 달성한러항로/ 러 연휴로 연초 물동량 부진美 철도기업 합병 불발…규제당국 신청서 불승인중동항로/ 중국발 물량 꺾이자 한달새 운임 20%↓한일항로/ 공급 축소해도 화물 채우기 쉽지 않아중남미항로/ ‘선사들 집화경쟁 후끈’ 운임 3년만에 1200弗 붕괴HMM, 특수화물 온라인예약 실시…“운송절차 간소화”
- 태웅로직스, 30주년 맞아 ‘100년 기업’ 선언中 양푸항, 지난해 ‘컨’ 처리량 330만TEU…전년比 65%↑KMI, 동서대와 해운항만 미래인재 양성 맞손선박들의 피항처 ‘거문도’ 올해의 섬 지정아프리카항로/ 물동량 호성적에도 운임 약세 이어져호주항로/ 춘절 특수 없다…해상운임 약세로 전환靑 해수비서관에 이현 前 해수부 장관 정책보좌관구주항로/ 춘절특수 실종…공급조절·운임회복으로 극복中 광시-베트남 지난해 화물열차운송량 3.7만TEU ‘역대최대’“어렵고 까다로운 위험물 물류 함께 고민해요”
스케줄 많이 검색한 항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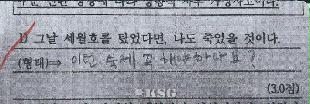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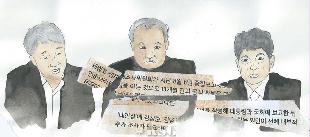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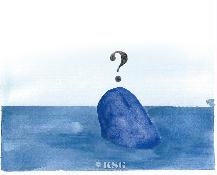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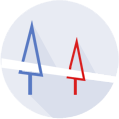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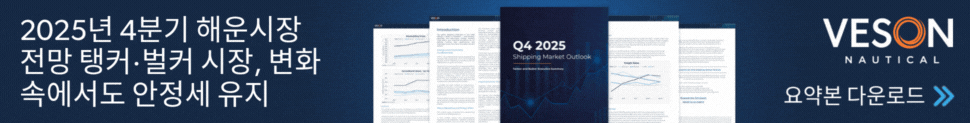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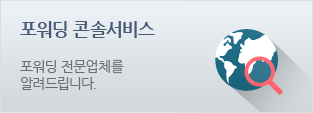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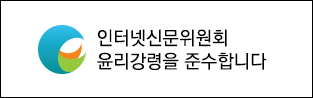


0/250
확인